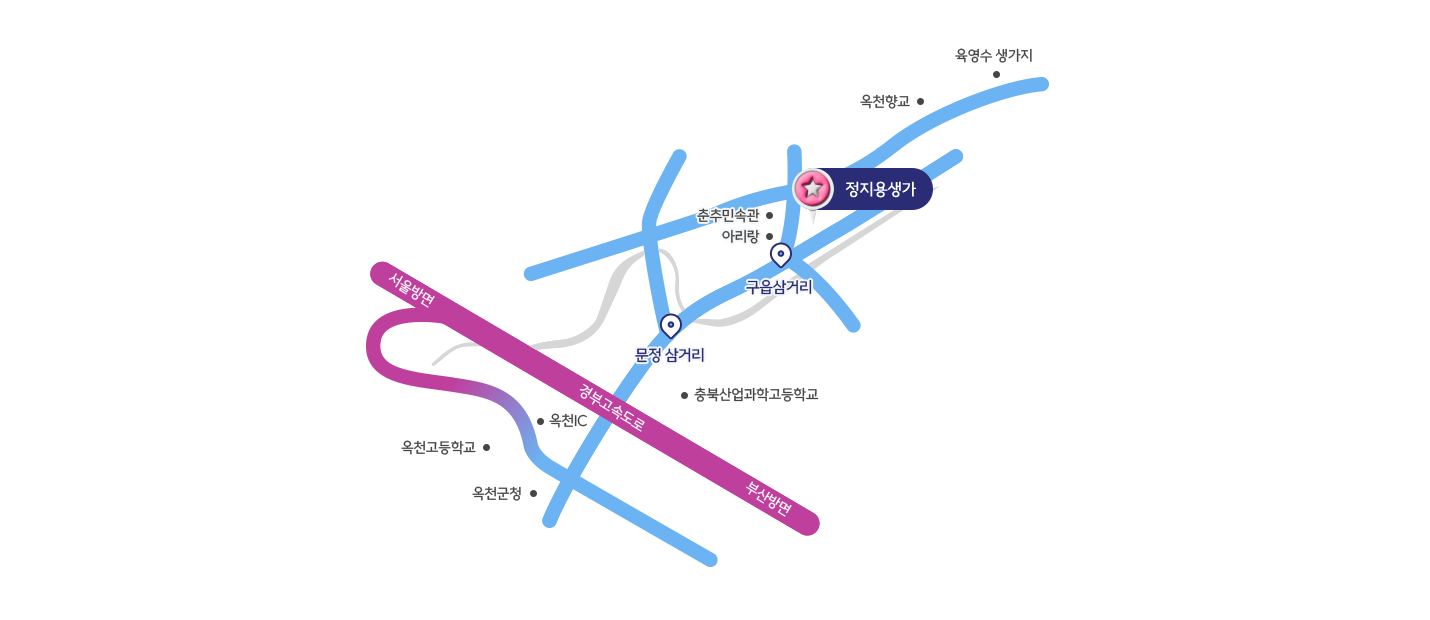섬세한 언어의 시인 정지용을 만나다.
뜰 안 텃밭 일구어 푸성귀 내어먹고,
소작(小作)시름 힘겹더라도 살뜰한
아내 덕에 부모자식 건사하면
행복하였던 시절
부엌 하나에 안방, 골방 나누고 방 앞에 툇마루 내고, 지붕에 이엉 얹어지면 초가삼간은 마련되었으며, 싸리가지 꺾고 엮어 마당을 비잉 둘러 세워두면 그 안은 뜰이었고, 집안 들락거릴 사립문 하나 엮어 세우면 어엿한 민가하나 지어졌었던 시절..

“배고프면 언제든 날아와 먹고 가라”는 인심에 보답하려는지,
까치는 가끔 반가운 손님소식 전했던 시절을 그대는 기억하는가.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우리네 전통민가 초가집은
대물림 가난에 시름 앓지만,
그래도 행복을 엮어가던 민초를 닮아 질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향의 집이었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의 여인네 버선코처럼 살짝 치켜 올려진,
처마 끝과 용마루 끝의 멋스러움이 아무리 높다한들 초가집의
질박한 아름다움에 비할까.
그러나 이제는더 이상 그 정겹던 초가의 풍경은 애써 찾지 않으면 다가설 수 없는 것이 되고 보니 고향가면 동구 밖 지키는 둥구나무만 늙어가고 있다.


‘시인 정지용흉상 제막기념 공연'이 있던 날.
호암아트홀에서 그 잊혀져간 고향의 옛 모습은 온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이동원, 박인수의 노래 ‘향수.'
그날 정지용의 시 ‘향수'를 가사로 하여 이동원의 다정한 목소리와 멀어져간 고향을 쫓는 듯, 아득한 박인수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 ‘향수'는 온 국민을 매료시켰다.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진 고향의 정경을 오롯하게 담아낸 정지용의 시 ‘향수'는 대중위에 도도하게 군림하던 국립오페라단원 테너 박인수를 대중 속으로 끌어내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정지용의 시 향수는 더 이상 암송의 대상만이 아니라 노래로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되었다.
예전에도 그랬건만 시인 정지용은 이 노래로 인하여 국민시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그 잊혀져 가던 고향의 정경은 이 노래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